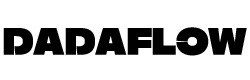상품’ 취급 당했다는 설리…지금 연예계는 달라졌을까 [D:이슈]
0
1939
03.17 17:51
상품’ 취급 당했다는 설리…지금 연예계는 달라졌을까 [D:이슈]
[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연예인 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는 상품이고, 사람들에게 최상의 상품으로써 존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미지 원본보기 ⓒ넷플릭스지난 1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설리 주연의 영화 ‘페르소나: 설리’의 ‘진리에게’ 편에서 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꾸며진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콘텐츠에서 설리는 “사람들이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를 모든 사람이 상품 취급했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야 했고,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야 했다”고 말한다.
ⓒ넷플릭스지난 1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설리 주연의 영화 ‘페르소나: 설리’의 ‘진리에게’ 편에서 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꾸며진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콘텐츠에서 설리는 “사람들이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를 모든 사람이 상품 취급했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야 했고,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야 했다”고 말한다.
‘인간을 상품으로 본다’는 말은 매우 거슬리지만, 실상 연예계에선 흔히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연예계에서, 설리가 세상을 떠난지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연예인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은 어쩐지 쉽게 변하지 않는 듯 보인다. 문제는 설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상품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 말이다. 대중의 입맛에 맞는 연예인이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을 활용해 이윤 창출을 하는 것, 그것이 기획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품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이다. 설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도 단순 ‘악플’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예인이라는 특성의 한 면인 상품화된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리를 비롯해 그간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많은 연예인들의 죽음 뒤엔 바로 이 ‘연예인이 상품화’라는 그늘이 존재한다.
이들을 보며 우리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로서의 관리는 물론, 그와 함께 사람으로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누군가의 죽음이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건 씁쓸하지만, 분명 인식의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심리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이런 시스템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황장애 등 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며 연예계 활동을 멈추는 사례가 흔히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의 사람으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구색 갖추기식의 심리 상담 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 아이돌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던 A씨는 “사실 심리 상담이 연예인의 심적인 고통을 모두 해소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연예인을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기획사와 대중의 공조 사이에서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편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상담을 거쳐간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연예인도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그만큼 본인들이 느끼기에 사람보다 상품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써의 연예인’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써만 연예인을 관리한다면 결과적으론 상품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지 원본보기
 ⓒ넷플릭스지난 1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설리 주연의 영화 ‘페르소나: 설리’의 ‘진리에게’ 편에서 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꾸며진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콘텐츠에서 설리는 “사람들이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를 모든 사람이 상품 취급했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야 했고,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야 했다”고 말한다.
ⓒ넷플릭스지난 1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설리 주연의 영화 ‘페르소나: 설리’의 ‘진리에게’ 편에서 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꾸며진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콘텐츠에서 설리는 “사람들이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를 모든 사람이 상품 취급했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야 했고,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야 했다”고 말한다.‘인간을 상품으로 본다’는 말은 매우 거슬리지만, 실상 연예계에선 흔히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연예계에서, 설리가 세상을 떠난지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연예인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은 어쩐지 쉽게 변하지 않는 듯 보인다. 문제는 설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상품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 말이다. 대중의 입맛에 맞는 연예인이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을 활용해 이윤 창출을 하는 것, 그것이 기획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품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이다. 설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도 단순 ‘악플’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예인이라는 특성의 한 면인 상품화된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리를 비롯해 그간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많은 연예인들의 죽음 뒤엔 바로 이 ‘연예인이 상품화’라는 그늘이 존재한다.
이들을 보며 우리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로서의 관리는 물론, 그와 함께 사람으로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누군가의 죽음이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건 씁쓸하지만, 분명 인식의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심리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이런 시스템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황장애 등 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며 연예계 활동을 멈추는 사례가 흔히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의 사람으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구색 갖추기식의 심리 상담 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 아이돌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던 A씨는 “사실 심리 상담이 연예인의 심적인 고통을 모두 해소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연예인을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기획사와 대중의 공조 사이에서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편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상담을 거쳐간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연예인도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그만큼 본인들이 느끼기에 사람보다 상품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써의 연예인’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써만 연예인을 관리한다면 결과적으론 상품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