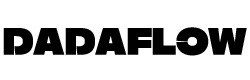[IS 시선] 불리지 않는 ‘하드 콜’…선수 보호 잊어선 안 돼
2024~25 KCC 프로농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하드 콜’이다.
지난 7월 유재학 프로농구연맹(KBL) 신임 경기본부장은 거친 몸싸움에 대해 더 관대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다. 유 경기본부장은 감독 시절 1만개의 수를 가지고 있다 해 ‘만수’라는 별명을 가졌다. 6차례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 누구보다 현장 사정을 아는 유 경기본부장이 심판 판정 변화를 외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시즌 KBL 플레이오프(PO)에선 잦은 휘슬로 인해 경기 흐름이 자주 끊겼다. 명확하지 않은 판정 기준까지 더해져 KBL 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억지로 파울을 얻어내려는 일부 선수의 행위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드 콜이 도입된 올 시즌은 어떨까. 현장 의견은 아직 제각각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적응해야 한다”는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
선수들의 접촉이 더 많아지고,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아 보는 재미도 늘었다는 커뮤니티 팬들의 호평도 이어진다. 지난 4월까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남자농구 무대를 누빈 DJ 번즈(소노)는 “KBL의 지향점은 당연히 가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판정 기준이 관대해지는 국제대회를 감안해도 KBL의 지향점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드 콜의 ‘기준’을 모르겠다”라는 지적은 여전히 나온다. 한 농구계 관계자는 시즌 전 KBL이 설명한 파울 범위와, 실제 KBL컵대회와 정규시즌에서의 판정이 다르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또 지난 20일 김상식 안양 정관장 감독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콜이 안 나오기도 한다. 적응해야 하지만, 모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하드콜이라고 해서 오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19일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개막전 당시 4쿼터 4분 31초를 남긴 시점, 이선 알바노(DB)가 개인 파울을 받은 장면이 대표적이다. 코피 코번(삼성)은 골밑에서 슈팅을 시도하다 볼을 놓쳤는데, 가까이 있던 알바노는 아예 접촉이 없음에도 파울을 받았다. DB는 이미 파울챌린지(비디오 판독)를 사용한 터라 판정을 뒤집을 기회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DB가 리드를 유지해 승리를 거뒀지만, 만약 삼성이 역전했다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졌을 것이다.
코트 위 몸싸움에 관대해지며, 선수들의 접촉 범위가 늘었다. 그만큼 부상 위험도가 커졌다. 소위 소프트콜이라 불린 이전보다 신중한 판정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KBL은 하드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더 이상 판정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또 불명확한 기준을 고수하기만 한다면, 진짜 파울로부터 선수 보호를 할 수 없다.
스포츠2팀 기자